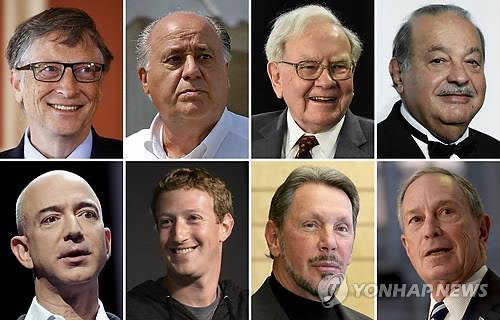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슈퍼리치 가(家)의 자산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배분·상속·증여·세금 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 주는 회사다. 이들은 초고액자산가들의 주택이나 직원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전용 제트기, 초고가 요트 등을 맡아 돌본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1882년 ‘록펠러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17일 한국경제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보고서 '패밀리 오피스 환경의 정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FO 수는 8030개로 2019년보다 31% 증가했다. 2030년에는 1만720개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굴리는 운용자산(AUM)만 현재 3.1조 달러에서 오는 2030년 5.4조 달러로 73% 급증할 것으로 딜로이트는 예상했다.
FO를 보유한 부유한 가문들의 총자산은 2019년 3.3조 달러에서 2024년 5.5조 달러로 불어났다. 2030년에는 9.5조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에선 FO 자산과 투자 자금 규모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런던비즈니스스쿨(LBS)는 글로벌 FO가 좌우하는 총자산 규모를 약 10조 달러로 추정한다. 이는 가문 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그림자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FO의 부상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권력 지형도 바꾸고 있다. 과거 패밀리 오피스는 PE 펀드에 접근하기 위해 줄을 서는 고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블랙스톤, KKR과 같은 거대 PE 운용사들이 패밀리 오피스의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황이 역전됐다.
이렇다 보니 유치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치 경쟁에 각국 나라들도 뛰어들고 있다. 가령, 중국 슈퍼리치들은 고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했다. 싱가포르는 현지 기업이나 펀드, 또는 패밀리오피스에 250만 싱가포르달러(약 23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2021년 싱가포르 운용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5조4천억 싱가포르달러(약 5천조원)를 기록했는데, 그중 4분의 3 이상이 외국 자산이었다.
다만 규제 움직임도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스와프 시장이 수백조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2019년 이후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감시는 완화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헤지펀드나 다른 기관 투자자보다 가벼운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일각에선 '규제 회색지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FO가 누리는 규제상의 특별한 지위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그에 따른 '패밀리 오피스 규칙'에 근거한다. 이 규칙은 단일 가문의 자산만을 운용하는 SFO를 '투자자문업자'의 정의에서 제외했다.

이 면제 조항은 패밀리 오피스에 막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엄격한 공시 의무, 컴플라이언스 요건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기적인 검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는 FO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을 거의 노출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규제 상황이 시장에 ‘정보 비대칭’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FO라는 명칭이 ‘규제 차익 거래’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들 패밀리 오피스 중 하나인 회사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차입 투자를 하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TRS나 대출 등 계약으로 엮인 투자은행(IB)들이 대거 블록딜(시간외 대량거래)로 주식을 팔아치워 뉴욕 증시를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면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